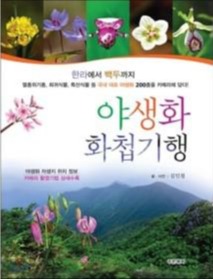(자다 깨다/자다 깨다/자다 깨다/자다 깨다/자다 깨다/자다 깨다(팔 바꿔서)자다 깨다/자다 깨다/자다 깨다…)
일전 감기 몸살로 이창기의 시 ‘남산 위에 저소나무’처럼 이틀간 꼼짝 않고 안방에서 자리보전을 했다. 텔레비전을 벗삼아 누웠다 앉았다 반복하는 사이 몸은 어느덧 게으름과 나태함에 익숙해져 가는데, 마음 한구석에선 뭐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 초조함이 고개를 든다.
그때 모처럼의 짧은 휴식에도 불안해하는 마음을 달래준 건 조선 성종때 문인 성현(成俔)이 지은 조용(嘲)이란 글이다.“경우에 따라서는 근면은 도리어 화근이 되는 것,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도리어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이 형세를 따라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당신은 물러나 앉았으니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 소리가 없다. 또 세상 사람들이 물욕에 휘둘리어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당신은 제정신을 보존하니, 궁극에 가서 어느 것이 흉한 일이 되고 어느 것이 길한 일이 될 것인가?”<2008/8/26>